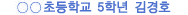지난 해 이맘때 쯤 외할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마지막으로 계셨던 병원은 갈바리의원이라는 곳으로 호스피스전문병원이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이별할 준비를 하셨다.
어느 날 나와 동생은 할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선물로 병원로비에서 할아버지를 위해 동요를 불러드렸다. 박수칠 힘도 없는 손을 겨우겨우 흔들며 우리를 향해 흐믓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노래를 마친 나를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더니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호야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늘 듣던 말씀이지만 그날 그 말씀은 내 가슴에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새겨졌다. 난 목이 메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를 안아드리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다.
이틀 후 할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셨다.
외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 때 총상을 당하셔서 국가유공자가 되셨다. 할아버지 옷깃에는 언제나 국가유공자임을 알리는 뱃지가 반짝반짝 달려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며, 누구보다 열심히 나라를 위해
충성하셨노라고 전쟁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셨다. 난 할아버지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 대전 현충원이라는 곳으로 모시게 되었다. 3 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도착한 현충원은
너무나 웅장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를 모시는 안장행사도 TV에서 보던 행사같이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수많은 비석들 사이에 할아버지를 모실 자리가 마련되어 우리가족은 할아버지와 마지막 이별을 하며 대전을 떠나왔다. 처음 모실 땐 비석이 완성되지 않아 임시로 나무 비석을 세워두었는데 그것이 3개월 후엔 돌비석으로 바뀐다고 하여 우리 가족은 3개월 뒤에 다시 현충원을 찾았다.
할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비석에 우리가족 이름이 모두 새겨진 것을 보았다. 엄마, 아빠, 이름 아래 나와 내 동생이름도 새겨져 있었다. 비석에 새겨진 ‘김경호’라는 이름이 나는 너무 신기하여 보고 또 보았다. 한참을 만져보고 쳐다보았다. 현충원을 떠나오는 길에도 내내 나는 내 이름이 생각났다.
‘김경호’ 그것은 마치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김경호’라는 나의 이름
세 글자도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지워지지 않는 도장같이 내 머리에 새겨졌다.
그래서 나는 항상 다짐한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처럼 나 ‘김경호’는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항상 노력할 것이다. 지금 초등학생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는 사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할아버지의 비석에 새겨진 내 이름이 이름값이라는 것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해 본다.
비가와도 눈이 와도 언제나 그곳에서 든든히 이 나라를 지키고 있을 할아버지의 비석,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내 이름 ‘김경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더욱 대한민국을 강하게 지켜나갈 미래의 내 모습을 위해 나는 내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아버지! 믿고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